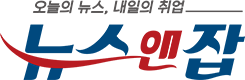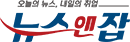출산 후 취업 가능성은 그 이전보다 약 37%p 감소하고, 출산 후 12년까지도 출산 전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출산 전 직업 교육을 받는다면 이런 불리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23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여성 취업자의 인적자본 투자와 경제활동 지속성' 보고서에서는 여성에 대한 출산 전 직업 교육이 여성의 노동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여성은 첫째 자녀를 출산한 후 취업 가능성이 37.2%p 감소하면서 경력단절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출산 전 직업 교육을 받은 여성은 취업 가능성 감소 폭이 19.9%로 줄었다.
이런 영향은 출산 직후뿐만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한 해 여성의 취업 확률은 출산 전 해와 비교해 26.7%p 감소하고, 첫째 자녀가 10살이 되는 무렵에는 출산 전 해와 비교해 42.8%p 감소했다. 12살까지도 40%p 안팎으로 감소세가 유지됐다.
대조적으로 직업 교육을 받은 여성은 출산 시점부터 출산 후 8년까지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 확률이 10%p 이상 덜 감소했다. 직업 교육이 출산 후 여성들의 지속적 경제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출산 후 6년까지 점차 증가하고, 출산 후 8년까지 유의하게 이어졌다. 취업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아지니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이 덜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다.
여성, 중소기업 취업으로 직업훈련 받기 어렵다!
직업 교육의 참여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직업 교육 참여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여성 68%, 남성 78%가 직업 교육에 참여하나 10인 이하 기업에서는 여성 42%, 남성 53%로 줄어든다.
보고서는 "비형식교육(정규교육 외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 참여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며 "여성이 남성보다 인적자본 투자 자체에 대한 흥미가 낮은 것이 아니라, 직업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적어 참여 비율이 낮은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교육 수준과 전공을 가졌어도 노동시장 진입 시점부터 남성보다 소규모 기업에 낮은 임금을 받고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청년 여성이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본인의 인적자본 수준보다 하향 취업하지 않도록 컨설팅을 포함한 선제적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 규모에 따른 직업훈련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0대, 50대 여성의 실업훈련, 남성의 두배
전체 실업 훈련 참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에는 64% 정도였지만, 계속 늘어 2023년에는 70%에 육박했다. 실업 훈련 참여자로 여성은 40대와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44.3%로 남성(22.2%)의 두 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여성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여성이 경제활동인구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적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 육아로 인해 일을 쉬었다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려는 여성의 수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