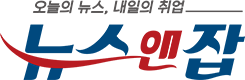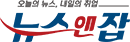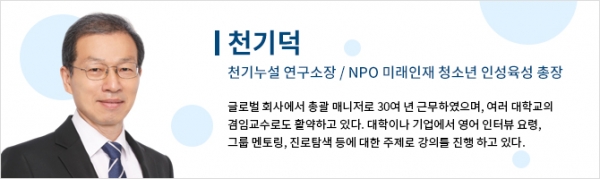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쓰기 17년 전, ‘도덕 감정론’에서 공정한 관찰자가 되어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간됨이 근본으로 서야 인간다운 삶이 되는 본립도생인 셈이다. 왜냐하면 도(道)는 근본적 인간의 길이다. 인간다운 인화(人和)가 없으면 인화(人禍)를 초래하기 쉽다. 그것은 마치 야구에서 '진루타를 치느냐 병살타를 치느냐'의 기로에 선 것과 같다.
21세기 뷰카시대에는 선택지가 많고 어렵다. 빠른 실패의 학습이 중요하다. 똑같은 길이 아니라 나의 소질을 개발하는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길을 가다 보니 참 다양한 길이 있다. 세종대로, 퇴계로, 율곡로, 신사임당로, 다산로, 강감찬로, 송설대로 등 사표로 삼고 싶은 길이 많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처럼 신비로운 비경이 있는 고매한 길이 즐비하게 많다. 그중 하나가 최송설당 대로이다. 영친왕의 보모였던 그분은 시대와 일상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은 선각자로서 고종으로부터 ‘송설’이란 호를 하사받은 문인이자 독립운동가였다. 그분으로부터 3가지가 배울점을 추려본다.
첫째 신분과 사회의 고정관념, 한계를 뛰어넘은 미래지향적 깨우침을 가졌다. 그 당시 이미 ‘깨부수자’의 글로벌 시각을 가졌다는 점이다.
둘째, 선각자로 지도층 인사들과 교류하며 집단지성으로 옳은 일을 실행하여 사학을 설립한 점이다. 인재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교육에 대한 애정과 지론, 신념이 투철한 예지인이다. 수인백년(樹人百年)의 대계는 자립과 독립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란 신념이다.
셋째, 인생 뒷단에 마음 수양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는 유산을 남겼다는 점이다. 이런 점이 다산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조선의 진정한 지성인이라 생각된다. 마음공부와 후손을 생각하는 미래안, 문인으로 활발하고 방대한 저술 활동, 빈틈없는 결단과 실행으로 폐족이나 식민지를 벗어나려는 큰 중심을 잡았고 근면과 학습을 강조한 점도 다산선생과 공통점이다.
필자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깨끗하게 부지런하게 배움을 계속하고 수양을 통한 성인급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것은 각자의 갈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다.
마음 수양은 곧 심청사달(深聽事達)이다. 잘 듣는 것(경청, 달청 Deep Listening)이 공감의 90%로 의식의 공통성이 있으면 성공의 80%는 이루어 내는 셈이다. 공감은 협력을 빠르게 잉태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덫에 갇히지 않고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동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눈, 가차없는 실행은 창조적 참살이로 존경하고 그 가치를 높이 사고 싶다. 훗날에 긍지와 자기 충만감을 가져도 좋은 본보기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늘 다가오는 문제의 본질을 꿰뜷고 지혜로운 해(解)를 구하는 그 길이 우리가 각자 개척해야 할 길이다. 문은 항상 열려있고 깨어있는 의식, 열린 마음, 옳고 바른 일을 민첩한 행동으로 임하면 해결된다. 우리는 모두가 통하는 대로(大路) 곧 신작로(新作路)라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의 개척자다. 선시(禪詩)처럼 오늘 내가 가는 길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나를 닦는 일이 우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편안함을 베푸는 것이 그 다음 덕목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베푸는 황금률이요. 논어의 진수라 할 수 있는 나를 갈고 닦는 수기(修己)이다. 그렇게 수양으로 탁월한 역량을 쌓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나의 존재가치가 아닐까.
‘길’이 주는 여러 가지 암묵적 지혜가 있다. 필자는 그것을 정주영 회장과 에머슨의 철학적 일갈에서 엿본다. ‘길을 가라.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길이 이끄는 곳으로 가지 말고, 길이 없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길을 남기라’고 하였다.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가는 것,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도약의 길을 가자. 선인들의 지혜를 사표와 지렛대로 삼아야 할 때이다. 잘 보고 잘 듣고 잘 협의하여 새로운 변혁을 생산하는 길이 우리의 가치를 빛내는 소명의 길이다. 최송설당 여사처럼 ‘깨끗하게 부지런하게’ 말이다.